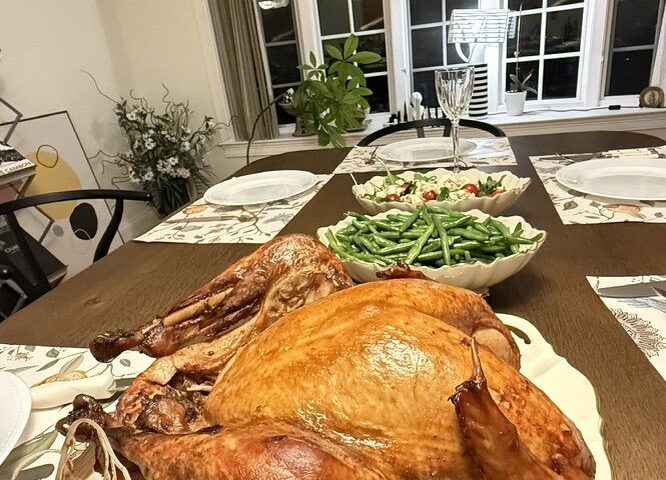미국의 도시 어디에서나 붉은 네온으로 빛나는 세 글자, AMC는 단순한 영화관의 이름을 넘어 한 세기의 대중문화를 상징한다. 1920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시작된 작은 극장은 어느새 800여 개의 지점과 9,000개가 넘는 스크린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상영 체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AMC는 영화 산업의 영광과 위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확산과 팬데믹의 충격은 영화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들었고, 관객의 발길은 디지털로 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C는 꺼지지 않았다. 리클라이너 좌석, 프리미엄 상영관, 콘서트 중계, 멤버십 제도 등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새로운 관람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거대한 체인은 지금 영화관의 미래에 대한 가장 생생한 답변을 스스로 써 내려가고 있다.

AMC의 역사는 곧 영화관이라는 개념의 역사이기도 하다. 1920년대 초, 폴란드 이민자 출신의 Dubinsky 형제는 캔자스시티에 한 극장을 열고, 영화가 단지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을 실험했다. 그 결과 1962년, 세계 최초의 멀티플렉스 ‘Parkway Twin’을 선보였다. 한 공간에 두 개의 스크린을 배치한 이 시도는 곧 AMC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이후 AMC는 리클라이너 좌석, 컵홀더, 스테디움 시팅을 도입하며 관람 환경을 지속적으로 혁신했다. 영화관은 단순한 상영 공간에서 ‘문화적 생활 공간’으로 진화했다.
1980~90년대는 AMC의 전성기였다. 복합상영관, 이른바 메가플렉스의 시대가 열리며 AMC는 도시 외곽의 쇼핑몰마다 들어섰다. 주말 저녁, 가족과 연인이 함께 찾는 장소, 청춘의 첫 데이트가 이뤄지는 무대는 AMC의 스크린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영화관은 점점 ‘느린 공간’이 되었다. 팬데믹은 그 위기를 결정적으로 드러냈다. 2020년 전 세계 극장이 문을 닫자 AMC의 매출은 90% 이상 급감했다. 극장 문이 닫힌 사이, 관객들은 소파 위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개봉작을 보았고, 영화관의 존재 이유는 처음으로 의심받기 시작했다.

AMC는 구조조정과 부채 감축에 나섰다. 일부 지점을 정리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했지만, 위기의 본질은 재정이 아니라 문화적 위치의 붕괴였다. 영화관이 ‘필수적’이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스트리밍의 편리함이 일상이 되자 극장은 사람들의 주의력과 시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AMC는 그 싸움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팬데믹 이후 AMC는 대대적인 가격 개편과 멤버십 확대를 단행했다. 회원제 프로그램 ‘AMC Stubs’를 중심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티켓을 절반 가격에 판매했고, 전국 주요 지점에 할인 행사를 도입했다. 동시에 IMAX, Dolby Cinema, Laser 상영관을 확충하며 ‘집보다 편안한 극장’을 표방했다. 리클라이너 좌석이 전 지점으로 확대되고, 일부 지점은 식사와 와인을 제공하는 다이닝 형태로 전환되었다. 관람은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휴식과 오락이 결합된 ‘체험’으로 변모했다.
AMC의 또 다른 도약은 콘텐츠의 확장이다. 영화뿐 아니라 콘서트, 스포츠 경기, 연극, 심지어 게임 중계까지 스크린에 올렸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필름 〈The Eras Tour〉는 AMC가 직접 배급을 맡으며 100개국 이상에서 개봉했다. 이 작품은 단 2주 만에 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AMC는 상영관을 넘어 문화 유통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스트리밍 시대에 영화관은 콘텐츠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환영받은 것은 아니다. 최근 AMC는 상영 전 광고 시간을 늘리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관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영화 시작 전 25~30분간 이어지는 프리쇼 광고에 대해 “AMC의 광고는 또 하나의 영화”라는 풍자가 나왔고, 회사는 결국 상영 시작 시간을 명확히 표기하고 광고 시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일은 단순한 고객 불만을 넘어 영화관이 ‘경험의 질’과 ‘수익 구조’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AMC가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은 관객 세대의 변화다. 젊은 세대는 스트리밍의 리듬에 익숙하고, 콘텐츠를 배경음처럼 소비한다. AMC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단지 관객 수가 아니라, 극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 자체다. 이를 위해 AMC는 이벤트형 상영과 테마 상영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클래식 회고전, 코스튬 데이, 팬미팅 상영 같은 이벤트는 티켓 이상의 경험을 판다. 2023년 여름 〈오펜하이머〉와 〈바비〉가 동시에 개봉했던 ‘바비하이머 열풍’은 그 상징적인 예다. 관객들은 SNS에서 해시태그를 달고 의상을 맞춰 입은 채 극장으로 몰려들었고, AMC는 그 해 최고의 티켓 판매량을 기록했다.
스트리밍이 영화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지만, AMC는 그 흐름을 거부하기보다 활용하는 길을 택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일부 작품을 제한 상영하며, 온라인 공개 전에 ‘극장 경험’을 제공했다. AMC의 스크린은 스트리밍 콘텐츠의 프리미엄 윈도우로 재해석되었다. 이는 극장의 소멸이 아니라 재배치, 즉 새로운 유통 생태계 속에서의 역할 재정립이었다.
AMC는 단순한 상업 체인이 아니다. 미국 도시의 공공적 공간이자 문화의 인프라였다. 가족의 주말 나들이, 첫 데이트, 학창 시절의 밤, 친구들과의 웃음이 모두 그 어둠 속에 저장되어 있다. 팬데믹 시기, 문을 닫은 극장의 적막은 공동체가 잃어버린 감정의 온도를 상징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던 순간이야말로 도시 문화의 본질이었다. 그런 점에서 AMC의 회복은 단순한 산업의 부활이 아니라 사회적 감각의 회복이다.

이제 AMC는 자신을 ‘극장 체인’이 아닌 ‘경험 플랫폼’으로 규정한다. 영화, 음악, 스포츠, 게임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 멀티콘텐츠 허브. 기술적으로도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과 실시간 관객 반응 데이터를 활용한 상영 실험을 준비 중이다. 가상현실을 접목한 체험형 상영관 구상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극장이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장소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공공장소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MC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영화관의 위기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되었다. 그 가능성은 화려한 스크린 기술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속에서 함께 웃고 숨 쉬는 사람들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스트리밍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극장은 ‘순간’을 전달한다. 그 순간이 있는 한, 스크린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 뉴욕앤뉴저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