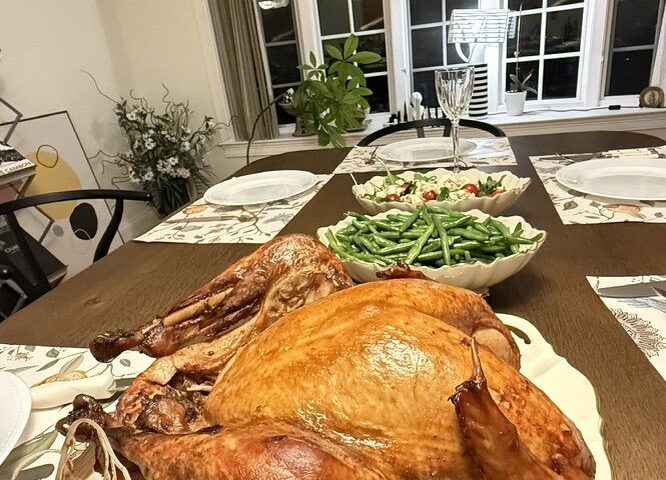중국의 팝마트(POP MART International Group, 泡泡瑪特)는 단순한 장난감 제조업체가 아니다. 2010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이 기업은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자”라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10년 만에 글로벌 완구 산업의 중심에 올라섰다. 불확실성과 희소성을 결합한 ‘블라인드 박스(Blind Box)’ 모델은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정밀하게 파고들었고, 감정적 만족을 산업의 핵심 가치로 전환시켰다.

팝마트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2020년 홍콩 증시에 상장한 이후 주가는 첫날 두 배 이상 급등했고, 2024년 연매출은 130억 위안(약 24억 달러)을 돌파했다. 불과 5년 전 매출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5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하며, 중국 내 블라인드 박스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었다. 이 같은 급성장은 단순한 장난감 열풍이 아니라 중국의 새로운 소비문화, 즉 감정 중심의 소비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팝마트는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판매한다. 소비자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어떤 캐릭터가 들어 있을지 모른다. 이 불확실성이 기대감을 유발하고, 기대는 곧 소비로 이어진다. 기업은 이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했다. 하나의 시리즈는 12개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중 1~2개는 희귀한 ‘히든 레어(Hidden Rare)’로 포함된다. 등장 확률은 1/144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 낮은 확률이 소비자의 반복 구매를 자극한다. 팝마트는 불확실성을 게임처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소비의 게임화(Gamification of Consumption)”라는 새로운 개념이 완성되었다.

가격 또한 절묘하게 설정됐다. 블라인드 박스 한 개의 가격은 약 59위안, 한화로 9천 원 수준이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면서도 ‘수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는 소비자가 죄책감 없이 반복 구매를 할 수 있는 심리적 한계선에 정확히 맞춰져 있다. 팝마트는 소비자의 감정을 통제하는 가격 전략을 통해 “작은 사치(Small Luxury)”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블라인드 박스 모델의 성공은 SNS의 확산과 맞물리며 더욱 강화됐다. 소비자들은 상자를 개봉하는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해 틱톡과 샤오홍슈 등에 올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희귀 제품을 교환하거나 자랑한다. 제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경험의 콘텐츠’가 되었다. 팝마트는 이를 ‘언박싱 마케팅’으로 공식화해 소비자 스스로 브랜드 홍보의 주체가 되게 했다. 소비가 곧 미디어 행위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캐릭터가 자산이 되는 구조, IP 경제의 확립
팝마트는 블라인드 박스라는 형식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 회사의 두 번째 성장축은 IP(지식재산권) 중심의 구조다. 팝마트는 장난감을 제작하는 기업이 아니라, 캐릭터를 창조하고 이를 콘텐츠화하는 IP 비즈니스 기업으로 진화했다. 대표 캐릭터 ‘Molly’, ‘Labubu’, ‘Skullpanda’, ‘Dimoo’, ‘Hirono’ 등은 단순한 피규어가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다.
‘Molly’는 2016년 홍콩 아티스트 케니 왕(Kenny Wong)과 협업으로 탄생했으며, 출시 직후 중국 젊은 여성층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무표정한 얼굴의 Molly는 ‘쿨함’과 ‘감정적 거리두기’를 상징하며, Z세대 정서를 대변했다. 이어 등장한 ‘Labubu’ 시리즈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컬트적 인기를 얻으며, 중고 시장에서 수십 배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팝마트는 이러한 IP를 중심으로 제품·패션·예술·전시·테마파크로 확장하고 있다. IP를 단순 상품의 장식이 아닌, 산업의 기반이자 장기적 수익원으로 삼았다. 2024년 기준 팝마트는 350개 이상의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자체 개발 캐릭터다. 전체 매출의 80%가 IP 기반 제품에서 발생한다.
이 구조는 디즈니, 산리오 등과 유사한 ‘콘텐츠형 제조업’ 모델이다. 하지만 팝마트는 서구식 캐릭터 산업이 아닌, 로컬 감성과 글로벌 예술 협업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한다. 중국 디자이너들의 개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해외 아티스트와 협력해 시각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이 전략은 중국의 완구 산업이 “복제품 시장”이라는 인식을 깨뜨리고, **‘창조적 IP 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Z세대의 감성, 팬덤을 시장으로 전환하다
팝마트의 고객층은 명확하다. 전체 고객의 75% 이상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여성이다. 이들은 단순히 장난감을 구매하지 않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 같은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류한다. 소비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의 수단이다.
팝마트는 이런 세대의 정서를 이해했다. 브랜드는 제품의 기능보다 감정의 공감을 강조한다. 광고 문구 역시 ‘작은 행복을 발견하다’, ‘하루를 위한 위로’처럼 감정 중심의 메시지를 사용한다. 팝마트는 제품의 물질적 가치를 감정적 경험으로 전환시키며, 소비자를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참여자로 포지셔닝했다.
이 감성 소비 구조는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수백만 건의 언박싱 영상이 공유되며, 제품 개봉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소비자는 자신이 얻은 캐릭터를 전시하고, 교환하며,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한다. 팝마트는 이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공식 앱을 통해 팬클럽, 포인트 시스템, 교환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팝마트의 유통 구조는 ‘팬덤 기반 자생 유통망’ 으로 진화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혁신을 넘어, 브랜드 신뢰를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팬덤은 새로운 고객 유입보다 더 강력한 재구매를 만들어내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팝마트의 실질적인 유통 네트워크가 되었다. 팝마트가 장기적으로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로벌 확장과 과제, ‘중국식 콘텐츠 산업’의 실험
팝마트는 이미 글로벌 무대로 향하고 있다. 런던, 파리, 로스앤젤레스, 도쿄, 서울 등 주요 도시에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판매기 형태의 로봇샵(RoboShop)을 해외 공항과 쇼핑몰에 확대 설치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30%를 넘었고,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해외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진출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현지화된 콘텐츠 전략’에 기반한다. 지역별 문화와 미적 취향을 반영한 제품 라인을 구성하고, 현지 아티스트와 협업해 로컬 정체성을 강화한다. 일본 시장에서는 미니멀한 감성의 ‘Skullpanda Zen’ 시리즈가, 유럽에서는 환상적 분위기의 ‘Labubu Fairy’가 인기를 얻었다. 팝마트는 이를 통해 “중국 디자인의 세계화”를 실험 중이다.
하지만 과제도 명확하다. 첫째, 블라인드 박스 모델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확률형 판매가 아동 대상 도박 유사 행위로 간주되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공급망 리스크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요인은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팝마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지로 생산 기지를 분산하고 있다. 셋째, 수집형 완구 시장의 유행성이 짧다는 점도 도전 과제다.
팝마트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P 라이프스타일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캐릭터를 중심으로 주얼리, 의류, 액세서리, 전시 사업으로 확장하며, 장난감 산업을 생활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친환경 패키징, 재활용 소재 도입, 윤리적 생산 시스템 구축 등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는 단기적 성장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감정의 경제, 팝마트 이후의 과제
팝마트의 성공은 산업 구조의 변화 그 자체를 보여준다. 이 기업은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감정의 경험을 팔았고, 불확실성과 기대를 수익의 원천으로 바꾸었다. 블라인드 박스는 단순한 피규어가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의 정체성과 감정을 투영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팝마트는 이 감정을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 감정 산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희소성은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고, 감정은 새로운 자극을 요구한다. 팝마트가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남기 위해서는 IP의 질적 확장, 글로벌 문화 적응력, 팬덤 관리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기업은 이미 애니메이션, 게임, 메타버스 콘텐츠 등 디지털 영역으로의 확장을 준비 중이며, ‘감정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팝마트의 사례는 중국 내 소비산업이 더 이상 모방형 제조업이 아니라 감성 중심의 창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을 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확인하며, 소속감을 얻기 위해 소비한다. 팝마트는 이러한 심리를 산업의 언어로 번역한 첫 번째 기업이다.
결국 팝마트가 판매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감정이다. 상자를 열기 전의 설렘, 희귀 캐릭터를 찾는 긴장감, 그리고 완성된 컬렉션을 바라보는 만족감이 이 기업의 진정한 제품이다. 불확실성이 곧 상품이 되는 이 경제 구조에서, 팝마트는 “감정의 경제”를 체계화한 첫 번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로써 팝마트는 전통 제조업에서 감성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끈 대표적 기업으로 평가된다.
작은 상자 안에는 피규어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욕망을 가장 정교하게 설계한 기업이 바로 팝마트였다.
앞으로 세계 시장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작은 상자를 열고 싶어 할까.
ⓒ 뉴욕앤뉴저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