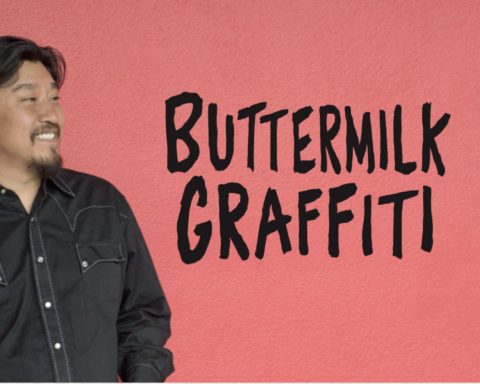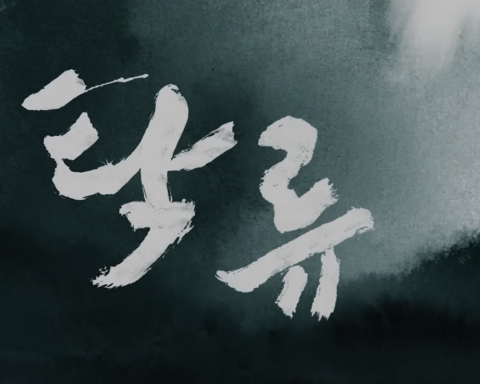한글날, 문자 이상의 의미
매년 10월 9일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며, 한글의 창제 정신과 그 우수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한글날의 의미는 이제 단지 문자 체계의 발명을 넘어, 언어가 문화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훈민정음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름으로 1446년에 반포된 이후, 한글은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의 언어로 자리잡았다. 조선시대의 학문과 행정에서 한문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도, 한글은 민중과 여성, 그리고 문해력이 제한된 계층에게 언어적 해방을 제공했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에도 ‘언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과학적이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ㅡ), 사람(ㅣ)을 상징하는 철학적 사유 위에 세워졌다. 이는 세계 문자사에서 보기 드문 독창성과 체계성을 갖춘 인공 문자로 평가받는다.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며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 평가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글은 한국을 넘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한글날을 맞아 미국에서의 한국어 위상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언어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힘을 갖게 되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국어 — 숫자로 본 성장의 궤적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국가다.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6천만 명에 달하며, 그중 약 107만 명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아시아계 언어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이민자 통계 이상을 의미한다.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꾸준히 유입된 한인 이민자와 2세, 3세 후손들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문화와 공존하는 독특한 언어 생태계를 만들어왔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주요 도시권에는 한인 커뮤니티 중심의 교육 기관, 한국어 주말학교, 교회 기반 언어 교육이 탄탄히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어의 위상은 ‘이민자 언어’를 넘어 ‘학문적 언어’, ‘전략적 언어’로 급부상했다. 그 중심에는 미국 대학 캠퍼스가 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ML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약 8,449명이던 미국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는 2021년 약 2만 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어·중국어 등 동아시아 언어는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한국어만은 꾸준히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K-pop의 유행’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로 ‘한류 콘텐츠(음악, 드라마)’뿐 아니라 ‘문화 이해’, ‘국제 비즈니스’, ‘글로벌 커리어 확장’ 등을 꼽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한국어를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과 함께 ‘필수 언어(Critical Language)’ 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외교·정보·경제 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언어군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즉, 한국어는 이제 ‘취미 언어’가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에서 전략으로 —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바뀌고 있다
한국어 학습의 동기는 지난 20년 사이 크게 변화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주요 집단은 한인 2세 유산 화자(heritage speakers)였다. 부모 세대와의 소통, 정체성 유지, 교회나 커뮤니티 내 참여 등이 학습의 동기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비유산 학습자(non-heritage learners)’의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이 변화를 이끈 것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이다.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같은 콘텐츠는 미국 젊은 세대의 문화적 취향을 바꾸었고, 동시에 언어 학습의 욕구를 자극했다. 듀오링고(Duolingo)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학습자 수가 증가한 언어 중 하나로,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이 배우는 아시아 언어 2위’에 올랐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문화적 진입’이 결국 ‘전문적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주요 대학, 예를 들어 하버드, 스탠퍼드, 컬럼비아, 뉴욕대, 듀크, 일리노이대 등에서는 한국어가 단순한 선택 외국어 과목을 넘어 한국학(Korean Studies) 또는 동아시아학(East Asian Studies) 의 핵심 전공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미국 내 기업과 기관에서도 한국어 능력자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언어 테스트 전문 기관인 LTI(Language Testing International)의 자료에 따르면, 약 9%의 미국 고용주가 한국어 능력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대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무역, 기술, 엔터테인먼트, 법률,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실무적 협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NSLI-Y(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for Youth) 는 한국어를 포함한 7개 필수 언어 학습을 장려하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수료생 중 상당수가 대학 진학 후에도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나아가 국무부나 외교 분야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는 더 이상 문화 콘텐츠 소비의 부속물이 아니다.
언어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문화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창구로 인식되고 있다.
도전과 과제 —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언어로’
그러나 한국어의 미국 내 확산이 단순히 긍정적인 성장 곡선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언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습 인프라, 교원 양성, 정책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은 지역과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 대도시권 대학에서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지만, 중소 규모 대학이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여전히 교재나 전문 교사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어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배정이 어려워 과목 개설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유산 화자(heritage speakers)와 비유산 학습자(non-heritage learners)의 학습 필요가 다르다는 점도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산 화자는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반면 문법과 쓰기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비유산 학습자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두 집단의 언어 능력을 구분해 맞춤형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속성’이다. 많은 학생이 한류 콘텐츠에 영향을 받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지만, 2~3학기 이상 계속 학습을 이어가는 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언어 학습이 단기적 흥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문적 커리큘럼과 실용적 활용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주미 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는 20개 이상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이며, 뉴욕·워싱턴·LA 등 주요 도시에 한국어 교육원과 TOPIK(한국어능력시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TOPIK 응시자 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로, 한국 대학 진학이나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비유산 학습자들이 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시대에 맞춘 한국어 학습 플랫폼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강좌, 모바일 앱, 유튜브 교육 콘텐츠 등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 한국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번역기술의 발전은 언어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오히려 “직접 배우려는 욕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뉴욕앤뉴저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