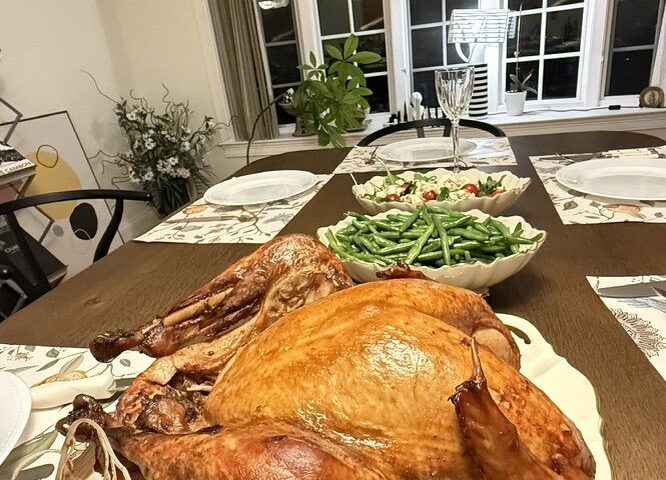2020년대를 사는 뉴요커들은 특이한 방식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 대형 공원이나 도시 외곽으로의 탈출이 아닌, 500 스퀘어 남짓한 아파트 창가에서 마주하는 초록 식물들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취미가 아니다. “플랜트 페어런트(Plant Parent)”, “식물 집사”, “보태니컬 셀프케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인스타그램에는 #plantparenthood, #monsteramonday, #urbanjungle 등 수백만 건의 해시태그가 넘쳐난다.

팬데믹 기간을 전후해 급증한 실내 식물 수요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고, 이제는 정체성 선언의 일부로 확장되고 있다. 뉴욕의 식물샵 “The Sill”은 팬데믹 기간 온라인 매출이 500% 급증했으며, 수많은 팝업 식물 마켓, 식물 전시회, 식물 테마 카페가 곳곳에 들어섰다.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불안정한 도시생활과의 타협이자 저마다의 작은 정원을 향한 갈망을 반영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이 단지 ‘예쁜 식물’을 소비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밀레니얼과 Z세대의 정체성, 불안, 환경감수성, 그리고 관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애착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자식을 갖기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돌봄의 욕구는 존재한다”는 밀레니얼의 목소리는 식물을 통해 ‘성장’, ‘관계’, ‘애착’을 경험하고 싶다는 시대적 감각을 보여준다.
불안한 세대와 식물 사이의 대화
보태니컬 붐은 단지 취미나 일시적 유행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사회에 진입한 밀레니얼 세대는 안정적인 직장, 내 집 마련, 가족 구성 등 ‘전통적인 성인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다. 여기에 팬데믹은 더욱 깊은 고립감과 통제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더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식물은 자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생명체, 즉 ‘통제가 가능한 자연’으로 다가온다.
뉴욕대학교 심리학과의 스콧 피셔 교수는 “식물은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관찰과 돌봄을 통해 예측 가능한 변화를 제공한다. 이는 무기력과 고립감을 겪는 도시인에게 심리적 통제감을 제공하는 매개체”라고 말한다. 특히 식물은 반려동물보다도 부담이 적고, 감정노동이 요구되지 않으며, ‘책임의 무게’와 ‘보살핌의 의미’를 적절히 조화시킨다고 평가받는다.

실제로 식물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NASA 연구팀은 식물이 공기 중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에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의 업무 집중도는 최대 15% 향상되었다. 일본 연구팀은 사무실에 작은 식물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직원의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의 한 ‘플랜트 바’에서는 요가 클래스와 화분 리폼 수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식물은 나를 대신해서 느긋해지는 법을 알려준다”고 말한다. 한편, 뉴욕식물원(NYBG)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가 “식물 키우기에 실패한 경험이 불안을 유발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식물은 위로이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생활 속 자연성’의 대체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는 식물 양육을 ‘가장 도시적인 육아’라 부르기도 한다. 즉,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돌봄 모델의 등장, 관계와 애착의 변화가 식물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 식물 도시가 되다
뉴욕은 식물 트렌드의 중심지다. 그 중심에는 ‘도시 속 자연의 회복’이라는 더 큰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 1970년대 ‘Green Guerillas’ 운동은 뉴욕의 버려진 공터를 커뮤니티 가든으로 탈바꿈시켰다. 당시 브롱크스와 로어이스트사이드의 방치된 땅들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과 ‘씨앗 수류탄’으로 되살아났다. 이 운동은 단순한 원예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과 생태 정의의 실천이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위에서 현재의 보태니컬 붐은 ‘개인적 공간’에서 ‘사회적 확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브루클린에서는 유기농 식물 마켓이 매달 열리며, 플랫부시에서는 교회 건물 지하를 이용한 수경재배 커뮤니티 팜이 운영 중이다. 뉴욕 공공도서관 일부 지점은 어린이를 위한 ‘씨앗 도서관(Seed Library)’을 열어, 책 대신 씨앗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소셜 미디어는 이 붐을 가속화하고 있다. 식물을 키우는 방식, 물주는 주기, 인테리어와 조합하는 팁까지 수많은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채널이 인기다. 특히 ‘Plant Kween’이라는 이름의 인플루언서는 뉴욕 퀸즈를 기반으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물과의 자기 돌봄’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숍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뉴욕의 식물 전문샵 “Horti”는 구독형 플랜트를 도입해 매달 새로운 식물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같은 희귀 식물은 하나당 수백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2025년 현재, 뉴욕의 보태니컬 트렌드는 ① 도시형 정서 치유, ② 기후위기 대응 문화, ③ 소셜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이것은 단지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식물을 넘어, 도시가 품은 불안을 풀어내는 새로운 사회적 언어로 기능하고 있다.
식물은 지금, 뉴욕의 시대적 감각이다
보태니컬 붐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다. 식물을 향한 뉴요커들의 집착은 삶의 방식, 정서적 언어,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다. 더 이상 ‘초록 식물’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다. 그것은 돌봄의 재구성이고, 도시 공간의 재해석이며,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우주다.

뉴욕이라는 세계적인 도시가 식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다.
바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자라고, 자라기 위해 우리는 연결된다.”
ⓒ 뉴욕앤뉴저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